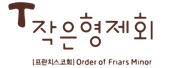새로 태어나는 삶 1/2 (성전 정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쫒아내시고 환금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 2,14-16)
허물어져 가는 하느님의 성전, 허물어야 하는 내가 만든 성전,
허물어져 가는 하느님의 성전은 내가 만든 성전에 의해 허물어져갑니다. 복음적 가치와 영적인 본질이 쇠퇴해 가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구삼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우상의 실재로 인하여 영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허물어야 하는 내가 만든 성전은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으로 쌓아 올린 물질적, 정신적 집착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명예, 권력, 재물과 같은 외적인 성공을 좇는 삶, 그리고 자신만의 좁은 생각과 편견 속에 갇힌 정신적 감옥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허상들을 과감히 부수고 내려놓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두 문장은 결국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진정한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본질과 가치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 내가 만든 인과응보로 만든 성전, 신심위주로 만든 성전을 부수고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과응보로 만든 성전이 하느님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인과응보로 내가 만든 성전에서는 살아온 삶의 결과로 쌓아 올린 업적과 공로로 만들어진 습관을 의미합니다.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원칙에 따라 형성된, 스스로의 삶을 투영하는 성전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옭아매는 내면의 굴레일 수도 있습니다.
신심(信心) 위주로 만든 성전 또한 하느님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신심은 종교적인 믿음과 경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부수어야 합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외적인 경건함,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치우쳐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상에 불과한 성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하느님의 성전,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경전의 문자를 넘어, 진리 그 자체, 혹은 근본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과거의 업보를 허물어뜨리고, 그 자리에 진리를 근본으로 삼아 다시 지어진 성전은 곧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업적과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낡은 성전을 허물고, 우리의 길이 되신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새롭게 재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을 말합니다.
허물어져 가는 하느님의 교회는 내가 만든 성전으로 허물어집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만든 독점과 소유라는 틀로 인하여 하느님과, 너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심각한 단절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하느님의 교회는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나 물리적인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부로부터의 부패와 쇠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허무는 원인으로 '내가 만든 성전'을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성전'이 '인과응보'와 '신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에서 독점과 소유라는 틀을 만듭니다. 독점과 소유의 틀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느님과의 단절: 하느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탐욕은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교류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웃(너)과의 단절: '독점과 소유'는 이웃과 나누고 공존하는 대신, 경쟁하고 배제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옵니다.
피조물과의 단절: 피조물을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여기며 착취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하느님의 공동체(교회)가 외적인 박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라난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내가 만든 성전'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다는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러한 내면의 성전을 먼저 부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내가 만든 성전에서는 포장하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펠라기우스와 얀센주의, 완전주의의 산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성전'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포장하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행위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투영합니다. 이는 내면의 충만함보다는 외적인 평가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본질적인 성장이 아닌 소모적인 경쟁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펠라기우스주의, 얀센주의,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무상성의 선물보다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게 만듭니다. 얀센주의는 극단적인 원죄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타락성을 강조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극도의 금욕과 엄격한 도덕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완벽을 증명하려 애쓰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주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완벽해지기 위해 끝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행태를 낳습니다. 이 세 가지 신학적 개념들은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구원의 중심에 놓는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는 무상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구원)을 쌓으려 했던 '내가 만든 성전'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만든 성전'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상의 은혜를 뒤로하고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