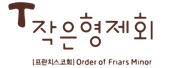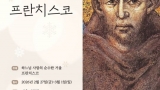by 고인현 도미니코 신부 ofm
아니마또레(이태리어): '보듬어 주고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자'를 의미합니다.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성모님을 ‘평화의 모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모후’(찬미받으소서 241항)로 모시며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생태적 회심(인간영혼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온라인 기도방입니다。
----------------------
2025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고 도미니코 신부
11월은 위령 성월이며, 오늘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아, 현세에서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의 노래에 담긴 ‘죽음’에 대한 시선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과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은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가는 성스러운 귀향이며, 삶 전체를 봉헌하는 마지막 찬미의 순간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두려움과 회피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금기시되고, 육신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여정이 아닌 패배나 실패의 징표처럼 여기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성 프라치스코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누구에게나 소름끼치는 일이고 저주스럽기만 한 일인 죽음, 그것을 찬미하도록 하였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안에 죽음이 머물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매 죽음이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육신의 죽음을 환대했습니다(『첼라노』 2생애 제2부 제163장 217 참조). 하느님과 하나 된 영혼의 기쁨은 고통을 압도했고, 그의 마지막은 찬미와 축복으로 가득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죽음을 ‘육신의 자매’라 부르며 기꺼이 맞이했고, 마지막 숨까지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감사의 언어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죽음을 피하고 잊으려 하며,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보다 두려운 사건으로 미루어두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감추는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달리, 죽음을 정화와 봉헌, 믿음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여정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위탁과 찬미의 훈련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죽음은 고통이 아닌 구원의 문이 되며, 두 번째 죽음이 해치지 못할 복된 영혼으로 초대받게 됩니다(묵시 20,6 참조). 프란치스코는 이를 확신하며, 육신의 죽음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처럼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겸손과 준비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죽음은 하느님께 찬미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이며, 그 여정을 향해 하루하루를 봉헌할 때, 우리의 삶과 죽음은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미가 될 것입니다.
----------------------------------
아니마또레 평화기도 다락방 11월 1주간
<금주간 성서읽기> 1테살 3-5장 / 2테살 1-3장 / 히브 1장
<생태 돌봄 주간> 자신. 이웃.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
성체성사(현존, 희생, 그리고 친교의 신비) / 로렌스 페인골드
제 1부
기초
제 1장
그리스도께서 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성체성사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들
2. 희생: 속죄의 보속 제물
그리스도교의 그리스 교부들은 이 신적 교환을 “구원의 경륜”의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 신적 교환, 곧 신적 거래는 혼인적 결합을 시작한다. 성육신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와 혼인하신다. 그분은 신적 신랑이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이다.
이 신비로운 약혼을 통해, 합당치 못한 신부는 신랑의 존엄으로 단장된다.
비록 천한 출신이지만, 그녀는 신랑의 지위로 높여진다.
이 약혼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에게서 선포되었다.
예를 들어, 호세아 2,21–22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다.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써 신의와 자비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또 진실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네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약 7세기 뒤, 세례자 요한은 그 약속된 신랑이 마침내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요한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