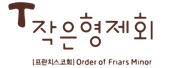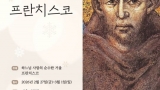by 고인현 도미니코 신부 ofm
아니마또레(이태리어): '보듬어 주고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자'를 의미합니다.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성모님을 ‘평화의 모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모후’(찬미받으소서 241항)로 모시며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생태적 회심(인간영혼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온라인 기도방입니다。
----------------------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루카 9,28)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교회의 아들들이다
세 사람만 선택되어 산으로 따라갔습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었고(마태 16,19 참조), 요한은 주님께서 당신 모친을
맡긴 사람이었으며(요한 19,27 참조), 야고보는 첫 번째로 주교좌에 오른 사람이었지요.
-암브로시우스-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대지를 품어 안은 엑카르트 영성) / 매튜 폭스 해제 · 주석
【셋째 오솔길】
돌파하여 자기 하느님을 낳기
설교 21
세가지 탄생
우리의 탄생, 하느님의 탄생, 하느님 자녀인 우리의 탄생
평화로운 침묵이 온 세상을 덮고 밤이 달려서 한고비에 다다랐을 때(지혜 18,14).
우리의 돌파는 우리의 새로 남을 구성한다. 그것은 요한 복음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하는 새로 남이다. 설교 17에서 엑카르트는 그것을 우리의 탄생과 결부시켜 말한다. 다른 곳에서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속에 머무르는 영혼 안에서, 하느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낳으십니다. 이 탄생에 의해 영혼도 하느님 안에서 새로 납니다. 그것은 하나의 탄생입니다.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새로 나는 만큼 자주 아버지께서도 영혼 안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낳으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것은 하나의 탄생”이라는 문장이다. 우리의 탄생 내지 돌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탄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들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엑카르트의 어법은 때때로 당혹스럽다.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탄생들은 각기 다른 탄생으로 나뉜다. 하지만 사건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현재” 속에는 하나의 탄생만이 있을 따름이다. 우리의 탄생, 하느님의 탄생, 하느님의 아들의 탄생은 하나의 탄생을 구성한다. 우리는 돌파를 자주 경험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탄생일 따름이다. “하느님은 이렇게 한다: 그분은 영혼의 가장 고귀한 곳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낳는다.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시간에 나도 아버지 안에서 그 외아들을 낳는다." 실로, 이 세 탄생은 한 탄생이다.(441)
<금주간 성서읽기> 1베드 3-5장 / 2베드 1-3장
<생태 돌봄 주간> 자신. 이웃.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
세계 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츤
제1기: 1500~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 개혁
제1절: 종교개혁의 전제들
중세 후기 교회의 폐해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경고음이었습니다.
개개인의 인간적인 배신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폐해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즉, 교황직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추기경들이 나쁜 교황을 선출하고,
또 그런 교황들이 다시 나쁜 추기경들을 임명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황은 교황령과 관련된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깊이 얽매여 있었고,
설령 어떤 교황이 진심으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더라도,
그 현실의 벽 앞에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던 **고귀한 교황 하드리아노 6세(1522–1523)조차도
그 개혁을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교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교직은 봉건적인 구조에 얽매여 있었고,
그 속박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기적인 귀족들이 주교좌 성당의 참사회(장로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참사회가 자기들 편의 인물 가운데서 주교를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주교는 다시 귀족 가문에 예속되어,
그들을 위해 복무하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족의 영향력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심지어 불가침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구조는 종교뿐 아니라 정치적 종속성과도 얽혀 있었습니다.
예컨대, 제네바가 프로테스탄트 도시가 된 결정적 배경은,
그곳 주교가 사보이 영주의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주와의 정치적 대립은
결국 교회와의 대립, 나아가 신앙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귀족-정치의 복잡한 얽힘은
도시, 교구, 수도원, 주교좌 성당 등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교좌 성당이나 공주 성직자단의 고위 성직자들 또한
비슷한 귀족 친족정치의 제약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까운 귀족 집안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수도원들은
영적 중심지가 아니라, 귀족의 생활공간으로 변질되었고,
그곳의 분위기는 귀족적 세속 정신이 지배했으며,
정말로 영적인 삶은 거의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성직자들도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은 보수를 받으며 고단한 삶을 꾸리는 보좌 신부들,
제단에서 미사 집전과 작은 봉사로 근근이 살아가던 하위 성직자들은
실제로는 “성직자 프롤레타리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배신이나 타락은 그들 개인의 도덕적 나약함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 시대의 사회 구조와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