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상의 풍경속에서 아들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Madonna and Child in a Landscape 1621-1624)
작가 : 오라치오 젠틸레스키(Orazio Gentileschi ; 1563-1639)
크기 : 30.8 x 23.4 cm
소재지 : 이태리 제노바 스트라다 노바 미술관((Musei di strada Nuova)
살기가 나아지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에의 관심을 키우는 일에 신경을 쓰게되어 오늘 우리 주위에서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 이런 욕구를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유럽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세로 이어지던 시대에 미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로크라는 화려한 화품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작가의 특징은 혼자만의 개성에 몰두하는 게 하니라 자기와 비슷한 견해로 화풍을 키우는 다른 작가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아름다움에의 열망을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
작가는 특히 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마치 오늘 사진기로 정확한 작품을 만드는 사작가와 같은 태도로 자연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 삶의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고 성화에서도 역시 과거처럼 상징적인 것에 표현에 대한 관심 보다는 아름답다는 느낌 만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해서 성화이면서도 누가 보던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으로 하느님은 바로 아름다움의 원천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아름다움이라는 인간의 심성을 바탕삼아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작가는 이태리 출신으로 여러 도시를 섭렵하면서 서로 다양한 화풍을 익히고 더 특징은 혼자 작품을 구상하기 보다는 자기와 취향이 비슷한 작가와 협력해서 일하면서 풍요로움을 더하게 되었다.
작가는 성모자에 대한 작품을 여러 장 남기면서 하나 같이 자연 풍경 속에 성모자를 등장시켜 신앙 안에 인간의 행복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계단에 앉아 아들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의 밑 부분은 성모자의 화사한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사막처럼 황량한 모습이다.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 40일 머무셨다는 광야를 연상시키는 풍경이다. 사막이나 광야는 비가 오지 않기에 우기를 제외하고는 식물들이 거의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에 말라빠진 잡초들이 듬성듬성 있는 이 부분의 모습은 바로 광야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 다음 성모님이 않아 계신 계단위로 보이는 벽 역시 훼손된 모습이라 누군가에 의해 개수되어야 할 정돈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아무런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젹을 암시하고 있다.
즉,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상기시키는데,인간의 현실이 너무 파괴되어 열악하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 오신 모습으로 마치 필리피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로의 찬가 연상 시킨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립피 2,6)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전벽해 (桑田碧海)처럼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명적 시도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것임을 한마디로 어떤 외면적인 형식적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변화 시키는 내면적 혁신이요 혁명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성모자의 옷 역시 다른 성화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전통적인 성화에서는 색채의 상징적 의미성을 강조하기 위해 푸른색과 붉은 색, 즉 하느님의 신성와 인성을 조화롭게 배합한 색깔을 많이 사용했으나 여기에선 이것과 전혀 부관한 여느 세상 인간들이 호감을 가지는 색깔을 표현했다.
한마디로 성덕의 모습이 이 세상을 떠난 곳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이 지닌 평범성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성모자의 모습 역시 당시 사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모성적 표현에서 하늘을 표현했다.
또한 옷의 명암을 표현할 때에도 단순히 어두운 색을 칠하는 대신 완전히 다른 색을 사용하여 옷의 표면이 두 가지 이상의 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색체 배합의 균형된 모습을 통해 하느님안에 살아가는 인간안에 드러나는 선성의 모습을 암시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오늘도 가령 수녀복이나 가정 부인의 복장이 마치 성(聖)과 속(俗)의 구분과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으나 작가는 여기에서 파격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성과 속은 외형적 취향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졋느냐와 관련되는 것임을 알리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은 우리가 깨트러야 할 잘못되고 미숙한 성속의 개념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여느 부인들과 같은 어머니 마음으로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서 인간들은 숭고하고 숭엄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숭엄함이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임을 알리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작가는 전통적인 것과 전혀 다른 표현을 통해 모성의 숭엄함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감있게 표현하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성모자의 발치에 보이는 시들어져 황량한 잡초와 성모자의 뒤에 있는 파괴되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담벼락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로서의 예수님이 해야 할 역할을 알리고 있다. 프란치스칸들은 성 프란치스코가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할 때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내집을 수리하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십자가로부터 들은 것을 프란치스코 삶의 기본으로 놓고 수도생활을 하기에 항상 수도원 마다 다미아노 십자가를 모시고 있다.
이 작품에서 역시 작가는 바로 허물어진 이 부분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런 사명을 지닌 아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의 아들을 키우는 성모님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한 인간임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 삶 자체가 고귀하다는 인간 삶에서의 긍정적인 차원을 너무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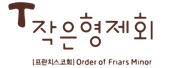
 제목 : 야곱의 사다리 (Ladder of Jacob: 1805년)
제목 : 야곱의 사다리 (Ladder of Jacob: 1805년)
 단테의 신곡 지옥도 제 3원 탐식(Dante's Inferno : The Third Ci...
단테의 신곡 지옥도 제 3원 탐식(Dante's Inferno : The Third 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