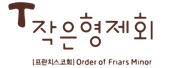by 고인현 도미니코 신부 ofm
아니마또레(이태리어): '보듬어 주고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자'를 의미합니다.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성모님을 ‘평화의 모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모후’(찬미받으소서 241항)로 모시며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생태적 회심(인간영혼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온라인 기도방입니다。
----------------------
그때에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마태 14,1-2)
허영과 두려움이 어우러진 상상
해로데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이지요? 그는 감히 드러내 놓고 그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시종들에게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신경과민에 빠진 군인이나 할 법한 생각이지요. 죽은 뒤 되살아났다고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헤로데가 생각하듯 요한처럼 되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로데의 말은 허영과 두려움이 어우러진 말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서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대지를 품어 안은 엑카르트 영성) / 매튜 폭스 해제 · 주석
【셋째 오솔길】
돌파하여 자기 하느님을 낳기
설교 21
세가지 탄생
우리의 탄생, 하느님의 탄생, 하느님 자녀인 우리의 탄생
평화로운 침묵이 온 세상을 덮고 밤이 달려서 한고비에 다다랐을 때(지혜 18,14).
엑카르트는 성탄 대축일 자정 전례 때 세 가지 탄생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가 신성 안에서 태어나는 것,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이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태어나 하느님처럼 되어야 한다. 엑카르트는 이 세 탄생 기운데 두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묻는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는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낳음이다 ... " “우리는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설교에서 말하는 돌파와 첫 번째 탄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낳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설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탄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첫 두 탄생의 결과로 세 번째 탄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세 번째 탄생은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 곧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엑카르트는 우리의 새로 남을 지칭하기 위해 한 단어를 만들어 낸다. 그는 그것을 일컬어 돌파라고 부른다.(439)
<금주간 성서읽기> 콜로 1-4장 / 필레 1장 / 1베드 1-2장
<생태 문화 주간> 음악/미술/독서 등. 생태 품앗이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원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일곱 가지 다양한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이룬다.
한 물체의 색깔이란, 그 물체가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색깔이듯이,
하나의 종교도 이처럼 다른 모든 색깔들을 흡수해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밖으로 드러내는 색깔은 사실상 그 종교의 외견상의 형태,
즉 바깥 세상에 대한 메시지일 뿐,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본성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의 종교를 그 내면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모든 색깔의 총체인 백광(白光)을 받는 물체가
하나의 빛깔만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은 자기 안에 흡수하듯,
하나의 종교 역시 그 외견상의 빛깔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는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다.
파니카(Panikkar)가 말하는 ‘무지개 모델’의 은유는
종교 다원론 담론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통찰을 제공한다.
파니카는 우선,
역사적 종교들의 구체적인 특성,
즉 고유성(固有性)과 다양성 그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무지개는 각각의 색상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때만
비로소 무지개로서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그러나 동시에 파니카는,
역사적 종교들이 드러내는 현상학적 혹은 유형론적 특징만을
그 종교가 말하려는 전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