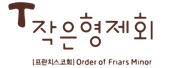by 고인현 도미니코 신부 ofm
아니마또레(이태리어): '보듬어 주고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자'를 의미합니다.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성모님을 ‘평화의 모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모
후’(찬미받으소서 241항)로 모시며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생태적 회심(인간영혼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온라인 기도방입니다。
후’(찬미받으소서 241항)로 모시며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생태적 회심(인간영혼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온라인 기도방입니다。
----------------------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루카 8,5)
토양을 경작하시는 유일한 분
철학을 곁들인 그리스의 기초 교육도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기름진 땅과 거름 더미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와 같은 것이었지요. 밀과 잡초가 같이 싹을 튀웁니다. 무화과나무와 잡목들이 무덤 위에서 같이 자랍니다. 그것들은 같은 빗물을 먹고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지만, 기름진 땅에서 자라는 것들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시들거나 뜯어 먹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씨의 비유도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안에 있는 토양을 경작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세상이 생겨났을 때부터, 잠재력을 지닌 씨앗들을 뿌려 오셨으며 당신의 말씀이라는 최상의 형태로 때에 맞추어 비를 내리신 분이지요. 다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때와 곳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대지를 품어 안은 엑카르트 영성) / 매튜 폭스 해제 · 주석
【셋째 오솔길】
돌파하여 자기 하느님을 낳기
설교 23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자 하느님의 어머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시오. 우리는 하느님 자녀라 불리게 되었으니 과연 그분 자녀들입니다(1요한 3,1).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보고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알려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조명을 받은 공기는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빛을 발하는 공기가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곰 그분 자신을 보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그대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나를 보고 앓으로써 “그대들의 마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기쁨으로 넘칠 것"(.요한 16,22)이다.
<금주간 성서읽기> 루카 14-17장
<생태 아낌 주간> 물.전기.자동차.구매와 소비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원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산의 등정로는 다양하지만 호연지기는 서로 통한다
1970년대 이후 제 3세계 국가들 안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 문화적 소외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극복을 위해 실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자각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에도 60억 인류 중 12억 가까운 사람들은 생존 자체의 위기를 겪으면서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의 희생자로 고통당하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간의 대화가 한가한 이론적 담론이나 펼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종교의 일차적 동기와 목적은 ‘이론에 있지 않고 ‘실천적 삶 에 있다는 것과,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위와 같은 세계 종교계의 각성은 과거 종교 전통들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현세적 힘과 지배 이념에 기생하거나 편을 들어주면서 종교의 올바른 기능을 상실해 왔다는 자기 빈성이 바팅이 된다.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유익하고'의미 있으려면, 이론적인 관심보다는 실천적인 관심으로 전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종교계의 경험도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국내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식량과 의료 지원, 남북 평화 협력 증진을 위한 협동, 자연 생태계 회복 운동과 녹색 문화 창달을 위한 대화와 협동.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공동 전선 구축 등의 실천적 체험을 통해서 , 한국의 종교들은 매우 긴밀한 유대감과 대화 협력의 정신이 증대됨을 체험하고 있다. 여하튼 세계와 한국의 현실 속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등산 모델'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