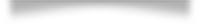T 평화가 그대들에게...
정원에 피어나고 있는 꽃 사진을 앵글에 담으려니
유난히 할머니, 엄마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늘 초봄이면 텃밭의 흔한 꽃들이지만 할머니는 요런저런 꽃씨들을 뿌리셨다.
"할머니, 요건 무슨 씨예요? 조건 백일홍 씨라고요? 빨강이 예뻐요, 노랑이 예뻐요? 채송화 씨는 왜 이케 작아요?
뒤켵의 복숭아 꽃도 곧 발그스레 피겠지요? 앵두는 언제쯤 익나요?..."
궁금한 게 너무도 많아 끊임없이 질문하는 손자에게, 할머닌 그때마다 주름지신 웃음 꽃으로 한번도 귀찮은 기색없이
답변을 잘 해 주셨다. 그때의 피어오르는 영상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늘상 기다려야 나타나시는 엄마처럼
무언가 가득한 그리움들. 온 누리가 연초록으로 변할 대자연의 변화에, 어쩌면 꼬맹이의 작은 가슴에도 그렇듯 연한 초록빛 물감이 자꾸만 자꾸만 채색되어 가는 것이다.
뒷 산 산새들도 어디선가 겨우내 자던 잠을 깨우고 고요하기만 하던 정적을 이따금 깨뜨리면,
"할머니, 왜 새들은 겨우내 어디에 있다가 봄이 되면 나타나는 거지요?"
"인석아, 겨울엔 추워서 잠을 자야 했거던. 이제 따사한 봄이니까 소풍나오기 시작한 거구."
자연의 모든 것은 그렇게 아잇적부터 특별한 감수성으로 다가왔고, 그 시절부터 무한한 경외심으로 익어갔나 보다.
엄마에 대해선 어땠을까? 엄마는 직장에 다니시어 저녘 땅거미질 무렵에야 볼 수 있었고 다음날 새벽이면 출근하셔야 했던 고로...
그래선지 밤의 잠자리, 엄마의 가슴은 늘 고사리 손의 전부일 수 밖에.
"오늘 낮에 뭐하고 놀았니?"
"응, 할머니하고 화단 가꾸었어요. 뿌린 씨들은 몇 밤을 지나야 세상에 나오나요? 얼릉 보고픈데...!"
그런 엄마는 쉬시는 주일이면, 부지런하시어 고단하신 기색도 없이 새벽부터 대청소며 밀린 집 안의 큰 일들로 온통
발칵 뒤집어 놓곤 하셨으니,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줄 알았다.
저녘 퇴근 시간이면, 늘상 고개를 치어들고 멀리 고갯길을 이제나 저제나 나타나시려나 학수고대하던 내 모습!
그래선지 지금도 꿈 속에 엄마의 존재는 매양 그리움, 기다림의 연속이어서 제대로 맘 편히 만나지는 법이 없다.
아까시아 향기가 짙어질 이맘때면, 솔솔 한강변에서 밀려오는 할머니, 엄마의 그윽한 향그러움!
어쩌면 두 분은 내 삶에 속한 전부였기에, 곁에 있는 자체가 행복이었으리.
어버이 날인 오늘, 이렇듯 정원에 눈길을 보내노라니 늘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들이며 한 땀 한 땀 손길이 간 꽃들이 화사한 요정처럼 할머니와 엄마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속삭여 준다. 그리고 흙이나 작고 큰 돌맹이와 바위들이 서로를
나누는 깊은 우정이며, 흙 속의 지렁이들도 때를 만나 꼼틀거리는 양이 그렇게 미더울 수가 없어, 도심 속 시골스러움이 잘 어우러진 기적이 아닌가 싶어진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신성한 믿음이 이 작은 정원에 가득찬 모습!
아득한 기억 속에 되살아 오는 어릴적 회상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 어른들의 사랑으로 더없이 폭은했던고향과 어린 시절! 마치 시간을 잊은 채 조용히 마주해 있는 멧비둘기 한쌍과 까치도 좀체로 자리를 뜨지않으려는 마냥 한가한 지금의 모습. 어쩌면 먼 과거일지라도 현재와의 사이에 내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은, 한바탕 꿈을 꾸는 꿈처럼 놀랄만큼 짧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할머니와 엄마의 존재가 늘 곁에 계시는 건 아닐까.